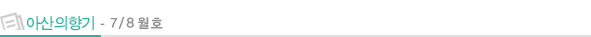|
 테마
테마 |
 곡선이면서 직선적인 삼색수다 곡선이면서 직선적인 삼색수다 |
남영숙 |
|
|
라면과 소면
1963년 9월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1년간 79개를 먹고, 국내 소비량 79억 개의 면발을 풀면 지구 허리를 4,616바퀴나 칭칭 감는다는 꼬불꼬불 라면. 2003년 오늘, 일종의 ‘구황 식품’으로서 가난한 이들의 소중한 한 끼이며, 밥 먹듯 날을 새는 야근자들의 ‘제 2의 식량’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하는 당신들의 옛 시절 라면은 ‘귀한 음식’이었다. 학교도 못 가고 고향을 지키는 막내가 안쓰러워 큰 누님이 수여한 주황색 삼양라면 한 상자. 막내는 숨겨둔 금은보화처럼 아끼고 아껴서 한 달 내내 먹고, 결국 탈이 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라 오히려 보양식이 투입된 건 ‘귀한 음식’의 아이러니.
피아노 건반 위를 흐르는 부잣집 무남독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처럼 곧은 백발의 소면(素麵). 통칭 ‘국수’ 부대 소속으로 제조나 조리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빵보다도 역사가 깊어, B.C. 6,000∼B.C. 5,000년경에 이미 아시아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인터넷 백과사전이 알려준다. 우리도 아주 오래 전부터 국수를 만들어 먹었지만 밀이 많이 나지 않아서 일상화되진 못한 탓에 소면은 생일·혼례 등 잔칫날의 특식이 되었다. 이것은 길다란 국수의 모양새가 생일에는 수명이 길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혼례에는 결연(結緣)이 길기를 원하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혼기 꽉찬 미혼 남녀에겐 ‘먹여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꽤 부담스러운 음식 중 하나다.
곱슬머리와 생머리
어렸을 때야 귀여울 뿐이지만 조금만 크면 곤란 무인지경이 되어버리는 곱슬머리. 두발 자유 없던 시절에 심각한 곱슬머리는 파마로 오인, 학생부장에게 귀가 잡혀 질질질 혼쭐이 나기 십상이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며 부모를 원망해 봐도(곱슬머리는 유전적으로 ‘우성’이란다. 서글픈 우성) 소용없는 일이다.
여기에 곱슬머리 박멸! 그 이름도 찬란한 매직 스트레이트가 등장했다. 심각한 곱슬, 당시의 유치한 별명대론 ‘장정구 라면머리’인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점의 유혹도 꾹 참고 알뜰살뜰 매진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자금을 확보했다. D-day, 그녀는 보무도 당당히 마술을 걸러 미용실로 갔다. 그리고 한참을 꼬았다 풀었다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던 헤어 디자이너 샘에게서 들은 한마디. “아이 참, 언니. 보·름·은 가요.”
정말이었다. 거금을 들여 다리미질한 친구의 머리카락은 딱 보름을 고속도로처럼 편편하였다가 열엿새부터 꼬불탕꼬불탕 수수께끼 스무고개처럼 원상복귀되었다. 심지어 최씨 성에 곱슬머리면 ‘성격이 심하게 있겠다’는 꼬리표까지 붙는 우리 곱슬머리의 비애다.
그 대척점의 생머리. 길고 탐스러운 검은 생머리 여인은 남자들의 환타지다. 남자들이 말하는 멋진 남자와 여자들이 말하는 예쁜 여자가 하늘과 땅 차이듯이, 건들건들 삼순이 파(派)에 속하는 나로선 같은 여자라도 긴 생머리들의 속은 잘 모르겠다. 다만 허리까지 찰랑찰랑, 대개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여리여리한 그녀들이 뭇남성의 보호 본능을 마구 일으키며 무거운 것 한 번 안 들고 편하게 공주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의자도 번쩍번쩍, 남자들의 말로는 ‘도대체 여자다운 맛이 없으며’ 그녀들의 변명으로는 ‘도대체 내숭이 안되는’, 전국에 산재한 삼순이들의 진지한 각성을 촉구한다.
머리카락은 남자들의 경우 뿌리부터 하루에 0.3cm씩, 여자들의 그것은 0.4cm씩 자란다고 한다. 그것이 자라고 자라 허리를 감싸기까지 그 인고의 세월은 분명히 존중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밤에 특별한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 납량특집에, 어느 공포영화를 봐도 곱슬머리 귀신은 없은 걸 보면 적어도 곱슬머리가 성격 있다고 하는 건 검증이 필요한 주장 같다.
여자와 남자
머리카락 얘기가 나온 김에 몸까지 늘여 남녀의 직선과 곡선에 관한 수다 멍석을 깔아 본다. 34-23-35인가, 아무튼 남자들이 말하는 여체에 대한 황금비율이 있다. 쭉쭉빵빵,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온 것이 글래머의 미덕이라고 불리운다. 그 커브의 기울기는 메이저리그 투수의 변화구처럼 급경사를 이룰수록 칭송된다.
하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들도 남자의 몸을 본다. 그 평가는, 내가 아는 한, 어느 수컷 무리 못지 않게, 신랄하고 예리하다. ‘인격’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배둘레햄’들도 Oh, NO!지만, 기름기 좔좔 울룩불룩 미스터 코리아들도 사절이다. 십여 년을 여중 여고 같은 중고등학교와 여대에 심지어 여대학원의 수녀원 코스만 밟다 보니 저절로 체득된 것이라 추정되지만 미인의 기준이 알고 보면 보편적이듯이, 어느 여인이나 무너뜨릴 만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스터 키’ 같은 남자 스타일도 있는 것 같다.
순정만화를 보라. 유능한 건 당연지사고 냉철한 성격에 알고 보면 한 여자밖에 모르는 남자. 그 남자들은 대개 180cm는 훌쩍 넘고, 피부는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며, 그 쭉 뻗은 단순명쾌한 골격은 흰 셔츠를 입었을 때 멋있다. 아니다. 그런 몸이라면 뭘 입어도, 안 입어도(?) 멋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여자건 남자건 정작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갈 사람, 즉 ‘내 여자’ ‘내 남자’만큼은 튀는 미인도 뽀사시한 꽃미남도 아닌 적당히 나오고 적당히 들어간 ‘보통 사람’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쓴이 남영숙은 아산장학생 동문으로, 현재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신동흔, 라면, 멈추지 않는 진화, 조선일보(2003년 4월 11일 61면)·라면세상 http://freeday79.gazio.com·두산 사이버백과의 도움을 받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