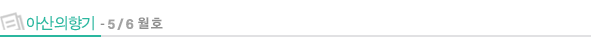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외숙모님께 外 외숙모님께 外 |
이종우 外 |
|
|
외숙모님께
선선한 바람이 하루를 채우면 다시 나른한 봄 햇살이 다음 날을 채우는 기상을 반복하는 요즘입니다. 이곳 벌교는 남쪽이라 따뜻한 편이지만 저희 포대는 고지에 위치한 탓에 서울 날씨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서울의 날씨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모두 건강하신지요.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 수발에 바쁘다는 말조차 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할머니 곁에만 계시지 마시고 틈틈이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 보세요. 병중에 계신 이를 돌보다가 자칫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요?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을 보면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자신은 늘 변함없고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해 하다가도 하루하루 커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모습조차 달라져 보일 때가 있지요. 늦잠꾸러기 아이들이 아침이면 학교에 가겠다고 부산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하네요.
당사자인 외숙모께는 전쟁을 방불케 하겠지만 저는 왠지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행복이란 어찌 보면 아무 일 없이 자신의 일상을 충실히 꾸려갈 때 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만족과는 사뭇 다른 감정일 테지만요.
식구들 대부분이 빠져 나간 오전 시간이 생각납니다. 군 입대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저에게는 약간 낯선 시간이었지만 부산함이 일순간에 빠져 나간 그 여유로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여성 카운셀링 프로나 작은 음악 소리가 집안을 심심하지 않게 채워 주고 나직히 끌끌대며 돌아가던 세탁기 소리, 막 설거지를 끝낸 그릇들에 맺혀 있던 물방울들, 그리고 달큰한 냄새를 가득 품은 채 알맞게 데워져 있던 진한 커피향….
가족들은 자주 들러 숙모님 도와 드리나요? 자꾸 찾아와 이것 저것 간섭하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도움받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현재 숙모님께 맡겨진 짐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자꾸 도움을 부담스럽게 여겨 거절하다 보면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세 무관심해지기 마련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다른 이들의 손을 빌리는 걸 덤덤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살구꽃이 푸지게 피었겠군요. 연례행사처럼 치르던 사진찍기는 하셨나요? 진하지도 흐리지도 않은 연분홍빛 살구꽃을 보고 있으면 그 하나하나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가지 가득 모여 도란거리는 모습이 우리네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등을 쓸어주며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화려한 생활보다 근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몇 장 제게도 보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작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무난할 것 같은 이 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곧 외박이니 그 때 찾아 뵙겠습니다.
필승!
늘 감사드리는 외숙모께 조카 종우 드림
이 글은 이종우 씨가 외숙모 박향기 씨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내 친구 칠성이
아마 30년도 더 지나버린 옛이야기 한 자락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대다수가 어렵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왜들 그리 식구들이 많았는지…. 보통 부모님 그리고 5남매 전후의 자녀 또 거기다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까지 계시기라도 하면 대략 6~10명 정도의 대가족들이었죠. 그러니 상당한 식량이 필요했었겠죠. 따라서 우리들의 배는 늘 꼬르륵 꼬르륵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 내 친구 칠성이(가명)네는 부모님 슬하에 형제만 다섯인데다가 자기네 농토는 적어서 더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었지요.
어느날 난 우리 밭에 시금치를 캐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이었는데, 절친한 나의 친구 칠성이가 팽나무 그늘 아래 묘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씨익 웃기만 하고는 고개를 숙여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밭에서 기다리실 부모님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하교길에 전해 들은 사연인즉, 그날 칠성이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늘 식사량이 모자라는 손자들을 위해 보리쌀을 듬뿍 넣은 밥을 한 솥 했더랍니다. 그 한 솥으로 다섯 손자를 실컷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밥을 마침 그 시간에 집에 있던 자기 형과 둘이서 다 먹어 버렸답니다. 게걸스럽게 먹어 대던 손자들을 외할머니께서는 차마 제지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과식을 한 칠성이에게 외할머니는 심부름을 시키게 됐고, 이 칠성이란 친구는 배가 너무 불러 걷기가 힘들어 그 팽나무 아래에서 잠시, 아니 한참이나 쉬고 있던 중이었더랍니다. 그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사연 중의 하나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연인 셈이죠.
세월은 흐르고 흘러 그 친구도 저도 이젠 1남 1녀의 의젓한 가장이 됐답니다. 어쩌다 소주라도 한잔 기울일라치면 그 시절 그 이야기로 추억을 더듬어 보곤 하지요. 이제는 그 친구나 저나 그런대로 살 만하건만 가끔 힘들 때나 울적할 때 옛 시절 그 정겹고 가슴아픈 사연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아마 애절한 정(情)의 강(江)이 깊이 흐르고 있기에 그리운 게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은 jyc2328을 ID로 쓰는 독자께서 보내 주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