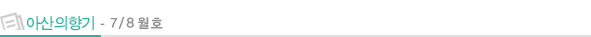|
 정훈소의 여백
정훈소의 여백 |
 섹스에 대하여 섹스에 대하여 |
정훈소 |
|
|
섹스에 대하여
남자의 그것은 배설, 즉 죽음에 있고 여자의 그것은 아이, 즉 삶에 있다
남자의 그것은 하늘에 가 닿으려 하고
여자의 그것은 땅에 발 딛어
뿌리내리려 한다
삶과 죽음, 그것은
같은 것이다
둘 다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오르가즘을 동반한다
섹스는 생명이다. 생명에 대한 열망이다. 그것은 목숨을 가진 생명체들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혹은 맹목적 의지이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 가장 단순한 방법, 혹은 표현이 섹스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해도 좋다.
섹스에 따르는 쾌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제 1의적인 것은 아니다.
생명의 수태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즉, 만약 섹스에 따르는 쾌감이 없었다 해도 우리는 섹스를 하였을 것이란 얘기다.
하긴 단 몇 초 동안의 그것이 뭐 그리 큰 대수이겠는가?
문제는 생명, 생명의 순환이고 잉태다. 시간상 유한한 생명으로서, 나의 생명을 나 아닌 다른 생명에게 주고 간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 나는 영원히 무(無) 속에 파묻혀 사라지지만 나를 닮은, 나의 유전자를 가진 누군가가 이 세상을 나 대신 살아준다는 것이다.
물론 섹스가 단순한 욕망의 배설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생명현상의 한 보기이다.
장 보드리야르는 ‘포르노는 가짜’라고 말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보여주기 위해 교묘히 꾸며진 어떤 것이라고.
그렇다. 그것은 포르노 배우의 어떤 부분만을 집중 조명하고 노출한다.
과장하고,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발달된 카메라 기술로 세밀 묘사한다. 하나도 즐겁지 않으면서 카메라를 잡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표정을 일그러트리고 거짓으로 신음한다.
따라서 내 컴퓨터 책상 밑에 숨겨놓은 CD나 테입들은 모두 시뮬라크르이고 LCD 액정화면의 주사선이 만들어 낸 이미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야, 환(幻)이고 거짓이다.
왜 그런가? 거기엔 사랑이 없고, 영혼의 교감이 없고, 생명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소영이란 아이를 만나기 위해 백화점에 간 일이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하기 위해 소영이와 백화점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백화점 갤러리에 들렀다.
누군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볼 줄 모른다.
그런데 나의 시선을 잡아끄는 추상화 한 점을 발견했다.
화면 가득 검은 물감을 짙고 두껍게 뿌려놓고 밤하늘의 유성이 지나가듯 실선을 하나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성적 오르가즘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아마 죽음의 순간도 그럴 것이다.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팽창되어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 아니면 한 줄기 빛살 속으로 날아가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어라 말할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과 무질서 안에 들어있는 상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이 한 몸으로 마구마구 뒤섞이는 상태일 것이다.
그렇다.
빛과 어둠, 여자와 남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은 본래 한 몸이다.
언표상, 어떤 편리를 위해 둘로 나누었을 뿐, 사실은 이분법적 나눔이 가능하지 않다.
어느 한 쪽을 떼어놓고 다른 한 쪽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상호보완적인 것이고 한 가지 현상의 두 가지 표현이다.
만약 이 세상에 삶만 있고 죽음이 없다고 해 보라.
자살할 수도 없고,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내가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혹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삶은 죽음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고, 죽음은 삶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세상 밖에 현현하여 드러낸다.
섹스의 순간, 나는 나의 짧은 오르가즘 속에서 머릿속 알전구로 환하게 켜진 나의 죽음을 보고, 문이 닫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 갈래의 빛살로 분산되어 날아가는 나의 삶을 본다.
빛과 어둠의 경계, 존재와 비존재의 나락, 잠시 시간이 VTR의 정지화면처럼 멈추고 나는 추상화의 그림 속에, 그림의 짙은 어둠 속에, 면도날처럼 예리한 빛살 속에 들어 있다.
벽을 더듬어, 문을 열고 나갈 수도, 나갈 수도 없다.
글쓴이 정훈소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삼성동 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밑 쳐 놓은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 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습작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시집으로 [ 아픈 것들은 가을 하늘을 닮아있다] 등이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