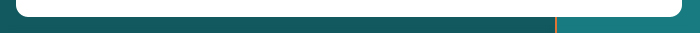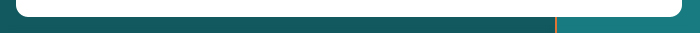|

대학생 때 일이다. 화창한 봄날, 한 여학생에게 딱지를 맞아 무척 심란했다. 우연히 음악다방에 들렀더니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는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꼭 내 마음처럼 절절했다. 그 노래를 자꾸 읊조리다 보니 마음이 많이 진정됐고, 그날 이후 ‘창밖의 여자’는 내게 불후의 명곡이 됐다.
사회생활을 하며 울적한 기분이 들 때는 브람스의 ‘알토 랩소디’를 듣는다. 슬픔으로 슬픔을 이기는 내 나름의 처방이다.
중학생 A군도 비슷한 경우이다. A군은 욕을 많이 하는, 언어폭력이 심한 아이였다. 보다 못한 부모가 지난 겨울방학 때 아이를 숙명여대 부설 음악치료센터에 데리고 왔다. 아이는 음악치료사 앞에서도 거침없이 욕을 했고, 악기를 거칠게 다뤘다. 그러나 악기를 크게 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된 것일까, 음악치료센터에 다닌 지 6개월이 된 지금 아이의 욕과 과격한 행동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뇌병변으로 꼬인 손의 마비가 풀리다
10대 후반인 B군은 뇌병변과 언어장애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손이 꼬여서 물건을 제대로 못 다루는 상태였는데, 숙명여대 음악치료센터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손의 마비가 많이 풀렸다. B군이 리코더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던 날, 담당 음악치료사 남궁지숙(33) 연구원은 너무 기뻐서 커다란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음악치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제천(祭天)과 주술 의식에 사용된 음악들은 모두 소통과 치유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음악치료 개념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정립됐다. 토마스 길드의 주도로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치료 음악회’가 개최됐는데, 이로부터 음악치료법의 큰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다른 설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육군통합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공연 뒤 환자들의 약물사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때부터 음악이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치료 도구로서 인식됐다는 것이다. 음악치료라는 명칭은 1950년 미국에서 공식 용어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1월, 한국음악치료학회와 대한음악치료학회가 설립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숙명여대와 이화여대가 음악치료대학원을 만들었고, 1997년에는 두 대학이 음악치료센터를 개관하면서 국내 음악치료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치료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병자 그리고 일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치료 대상이다. 뇌병변과 지적장애, 자폐증, 학습장애, 발달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 정신분열증, 우울증, 치매, 트라우마(외상후 증후군)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갈등 등이 음악치료기관을 찾는 클라이언트(내담자)를 괴롭히는 장애 및 질병이다.
연주, 작곡도 음악치료 활동
음악치료에는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작곡하는 등의 음악 활동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고 토론하기와 신체 이완하기, 명상하기도 음악치료의 일부분이다. 음악치료는 각종 악기를 구비하고, 방음장치 등이 갖춰진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대학 부설기관이나 사설 음악치료센터를 방문해 이루어진다.
국내에는 아직 국가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없다. 앞서 언급한 한국음악치료학회와 대한음악치료학회 그리고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등에서 각각 시험을 본 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음악치료대학원 졸업이라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평생교육원이나 전문 인가과정에서 단기교육을 마친 뒤 음악치료사를 배출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국가에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음악치료사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악치료사가 되면 병원이나 학교, 사설 음악치료센터, 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숙대 음악치료센터에는 4명의 음악치료사(연구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인 남궁지숙 연구원은 현재 숙대 음악치료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녀는 동덕여대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음악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음악 교사가 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졸업에 즈음해 교사가 과연 자신의 길인지, 인간과 삶은 과연 무엇인지 회의하고 고민하다가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음악치료사들은 임상심리나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따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는 2년 전 가족상담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했다. 석사과정을 마친 뒤 소아청소년연구소를 거쳐 2008년 8월부터 숙대 음악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제는 음악치료사가 제 길이라는 걸 알겠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해서 함께 반응하고, 역동적으로 관계 맺으며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데서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한 클라이언트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음악치료사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유난히 힘든 날들, 그때마다 내 딸에게 힘이 되어 준 희망의 샘물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